Empty House
Jaehyun Kim, 2021
If the image of nature that is inextricably linked to us suddenly feels banal, it is usually because of the gap between how we perceive it and the ability to portray it. As the definition of living things and the role of human beings in nature is constantly changing and recognized once more even in the same image, we perceive our position differently between observers and participants within a time difference.
My writing and work is about “the conviction that I'm somewhere.” We project our consciousness onto nature, and I also can detect changes in my own consciousness by recording my perspectives on nature. This kind of observation can be risky because the haste to connect the random to the meaningful and the complacency to stay in a story without content are revealed without filter. But there is no other way either. This internal search for the source of my creative desire has taken the form of finding something that becomes an intersection between various attempts rather than constructing a single order through a solid conceptual setting.
Writing here also has no specific starting point, so no clear link will be given. I wrote while contemplating the conditions that enable the face-to- face, focusing on the fact that a work is to face the people who see it. It begins with a scene where you face yourself through your work.
I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and body, looking for something I can be sure of. I have to adjust the space with different speeds so that I can live in between, revisiting the causes of the things I am repeating and speculating on the things that attract me. I believe that is the way to find my speed among things that pass so fast or too slow and to see where I am standing on a changeable ground.
I have a habit of starting with the subheadings that interest me in the table of contents. In the end, it is up to the viewer to give order, so regardless of the order in which the text is placed, I sincerely recommend starting with the page that interests you. Because the story will not go anywhere.
#0 소개글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연의 이미지가 갑자기 진부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대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생물에 대한 정의와 자연에서 인간의 역할이 동일한 이미지에서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식되면서, 우리는 시차를 두고 관찰자와 참여자 사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나의 글과 작업은 '내가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 우리의 의식을 투영하고, 자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의식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무작위를 의미 있는 것으로 연결하려는 성급함과 내용 없는 이야기에 머물려는 안일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찰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없다. 이러한 나의 창조적 욕구의 근원에 대한 내면의 탐색은 견고한 개념 설정을 통해 하나의 질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들 사이의 교차점이 되는 것을 찾는 형식을 취한다.
여기에 글을 쓰는 것 역시 구체적인 출발점은 없으며 명확한 연결고리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작품은 보는 사람과 대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대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고민하면서 글을 썼다. 글은 자신의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대면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나는 시간과 몸의 관계를 관찰하면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서로 다른 속도로 공간을 조정해서 머물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들의 원인을 다시 찾아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에 대해 추측해야 한다. 나는 이 방법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과 너무 느리게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서 자신의 속도를 찾고, 변화무쌍한 땅 위에서 스스록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나는 책을 읽을 때 나의 관심을 끄는 소제목부터 시작하는 습관이 있다. 결국 순서를 정하는 것은 보는이의 몫이므로 텍스트가 놓인 순서와 상관없이 관심을 끄는 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다고해서 원래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진 않는다.
The shape, size, texture and weight of the work are grounded in a belief: the structure and form of a lie are fundamentally true. I have no desire to explain how faith works. However, I assume it is a similar phenomenon to the fact that all the scenes and narratives in it are already possible, and can begin to be understood by knowing that it is a dream. Images, unfortunately, account for only one digit out of 24 frames per second in film. Stuck between cost problem and boredom, the image both implies and deviates from them. At the same time, it is a small particle, so it continues to survive in different forms. This situation makes it natural for the image to stumble through its story and its location.
Making an image is to start dreaming of a place. You have to stretch around it based on the moment you can return to that place. As heavy as the weight of a thermos that can be carried in a bag, the illusion that we can remember is the weight of the image that we can carry in a day.
The scenes you want to express and the scenes that can be expressed have no choice but to change. In order to execute, I have to stick to a specific gravity, light, temperature, and humidity. This is where unlimited thinking first feels resistance. Unrecognizable comfort, such as when a breeze corresponds to the temperature of one’s body, becomes a faint milestone. It stems from the conviction that you will feel again tomorrow what you sensed today. The memory of the senses survives among the perverse moments that continue. It's like building a house in your mind, so that it can point you in the direction of returning.
The house ironically has no shape. At a certain alley, the house suddenly appears. Even if you pass that alley dozens of times again, the moment is not the same. It is necessary to retrace the conditions of the moment. One must doubt that the sum of the conditions will soon be able to reproduce the memory entirely. The only way to capture the evaporable house is by constantly weighing the point between the most agile sensations and the language that can express it with the most subtlety. We must find a place to stand under bizarre conditions where repetition is observed but cannot be repeated.
Back to the story of images, I ask myself why I mainly do painting under these conditions. Perhaps it's simply because for a long time, it has been the language I've honed with the most confidence. Images reduce their status as smaller basic units as other media proliferates in more complex ways, but since they are basic units, the ability to process images can have infinite possibilities. What is certain is that the more I try to give a certain meaning to the “painting” by myself, and the more I try to contextualize my works with logical reasoning, the farther away I feel when dealing with paintings. The concept of a place is very abstract and personal to me. No one is actually looking at the exact same thing, so we are constantly trying to feel the same thing, or believe that we are feeling the same thing to feel connected. Simply, a good picture traps many people in a small room. The better the picture, the longer it locks us up. Although it cannot be proved by numbers, a picture clearly keeps the viewer in it for a long time and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feeling the same thing between one another. There is no cost issue or boredom. I feel the paradoxical potential within a single image and that's what keeps me building a virtual house.
#1 가상의 집
작업의 형태, 크기, 질감, 무게 등은 거짓말의 구조와 형태가 근본적으로 진실이라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그 속의 모든 장면과 서사가 꿈이었다는 인식만으로 이미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필름에서 이미지는 안타깝게도 초당 24프레임 중 한 자리만을 차지한다. 비용 문제와 지루함 사이에 끼어 있는 그 한자리의 이미지는 포착되지 못하기도 하고 복선을 내포하기도 한다. 동시에, 그것은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생존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지가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듬어나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 장소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장소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을 중심으로 나래를 펴야 한다.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보온병 무게만큼이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환상은 하루 동안 간직할 수 있는 이미지의 무게이다.
표현하고 싶은 장면과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은 멈춰있지 않다.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특정한 중력과 빛, 온도와 습도를 기억하고 고수해야 한다. 무한한 생각이 처음으로 저항을 느끼는 지점이다. 미풍과 체온의 온도가 구분되지 않을 때처럼 인식할 수 없는 편안함이 희미한 이정표가 된다. 오늘 감각한 것을 내일 다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꿈은 시작된다. 감각에 대한 기억은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들 사이에서 살아남는다. 그것은 마음속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가리킨다.
그 집은 형체가 없다. 어느 골목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그 골목을 다시 수십 번 지나쳐도 그 순간은 같지 않다. 그 순간의 조건을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집을 기억하는 누군가는 조건들의 합이 곧 그 기억일 수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무형의 집을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민첩한 감각과 그것을 가장 미묘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사이의 점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복이 관찰되지만 스스로는 반복할 수 없는 기괴한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미지 이야기로 돌아가서 왜 이런 조건에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식 중 주로 그림을 그리는지 자문해 본다. 누구도 실제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것을 느끼려고 노력하거나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믿으려 한다. 여러 매체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현실을 묘사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화가 인간에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장면을 포착하고 전달 할 수 매체라고 믿는다. 회화는 본인의 감각과 기억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면을 여러 시간대에 거쳐 이미지의 수정과 재확인(방문)하는 과정을 통해 확신해나가는 과정이다.
때로 좋은 그림은 많은 사람을 간단히 작은 방에 가두어 놓는다. 이미지가 호소력을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타인의 존재를 더 깊이 체감한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일지라도 비용 문제나 지루함은 없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회화에서 여전한 잠재력을 느끼고 그것이 내가 계속해서 가상의 집을 짓는 이유이다.
In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s, it is not possible to sketch or set down brushstrokes multiple times on the same side due to the permeability and fragility of the paper. When composing a screen,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adjusting the shade in one stroke, operating the brush through repeated skilled movements, and measuring the interval between strokes at every moment. The work before and after the painting, which controls its surface and thickness, is structured, and unlike other painting materials, its arbitrary application is very limited. In fact, many try to make variations between the materials, but most do not create new enough visual effects to doubt the frame of the limitations. This is due to the strong complementarity of the three materials of paper, brush, and ink in traditional East Asian paintings. [1] The viscosity of ink and the characteristic permeability of thin paper require a specific speed of motion according to the shape to be drawn. The time constraints created by this physical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require more precise correction of the artist's movements. The artist predicts in advance the shape his brush will produce and determines the path and speed of the brush. The low saturation of the ink and the nature of not creating texture highlights the painter's ability to deal with his body and time. This is to practice movement and visualize the practice through the promise of materials.
Unlike traditional painting, the combined use of unstructured complementary materials has a completely different starting point. There can be a number of different cases depending on the properties between materials such as the degree of drying, color and texture, and transparency. This degree of freedom requires the artis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speed of the material and to establish an order between the materials. It feels as vague as it is to fall to an unmarked place and give the cardinal directions of East, West, North, South as well as right, left, up and down. I feel a kind of honesty in the way the artist's movements are projected on the screen in East Asian painting, and I believe there is still a point where it can be interpreted as a certain standard. Handling materials within comprehensible domains is important for visual communication, but sometimes the domain of understanding widens when materials are handled in new ways. In paintings without specific visual rules, I see the fresh rules still in the condition of the human body. It’s fun to imagine how the painting has been handled by the artist as a rectangular wooden frame covered with canvas. The texture and traces of the material on the screen constantly suggest a trail of movement. The details of the finish, the change in the angle that the effect implies, and the setting of the distance make us imagine how the artist reacted to the material and through what process he was transformed from a producer to an observer.
My concern is not a thirst for new knowledge which seeks to find new complementarity or dig into hidden relationships between materials. When we hold something precious in our hands, we can see how much our five senses actually grasp the world at different speed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range of how each of us perceives our own body has changed in unprecedented ways, and the sensitivity of each of our senses is also rapidly changing. Just as when we are careful not to spill water, the speed of each material still requires us to act with corresponding care. My concern is whether the instinctive sense of unity such as that present in breath, gaze, and sense of balance can still be visually expressed and understood. The images of traditional painting, which have been building visual rules for a long time are losing their effect as the fixed concept of a body that formed the axis with materials changes. Maybe we no longer have a common concept of body that allows us to fully follow or appreciate such paintings. In the aftermath of COVID-19, the boundaries between material and non-material, reality and virtuality have become the most blurred since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At this point I still see the constraints of materiality as a condition for our senses and emotions to be in the right place. Traditional media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s feel more inefficient and painstaking than ever at this point. A work suggests the body of the artist who produced the work and their actions. Maybe we're in a long fight with someone we don't know about the status of our body.
[1] Yongjin Cho. How to read Oriental paintings, On the current problems of Korean painting and future directions, 180p
#2 그림의 몸
동아시아 전통회화에서는 종이의 투과성과 연성때문에 같은 면에 붓질을 여러 번 그려 넣을 수 없다. 화면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획으로 음영을 조절하고, 반복하여 숙련된 움직임을 통해 붓질을 조작하며, 매 순간 붓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것이다. 표면과 두께를 조절하는 그림 전후의 작업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다른 회화 재료들과 달리 임의적인 덧칠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재료의 변형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은 제약의 틀을 의심할 만큼의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는 동아시아 전통회화에서 종이, 붓, 먹의 세 가지 준비물의 강한 보완성 때문이다. [1] 잉크의 점도와 얇은 종이의 특징적인 투과성은 그려질 형태에 따른 특정한 운동 속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재료 간의 물리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시간적 제약은 작가의 움직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교정을 요구한다. 작가는 자신의 붓이 만들어낼 형태를 미리 예측하고 붓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한다. 잉크의 낮은 포화도와 질감을 만들지 않는 특성은 그리는 이의 신체와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부각시킨다. 이는 재료의 약속을 통해 움직임을 연습하고 그 연습을 시각화하기 위함이다.
구조화되어있지 않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회화와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 있다. 건조 정도, 색상과 질감, 투명성 등 재료 간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도는 작가에게 재료의 특성과 속도를 이해하고 재료 간의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표시되지 않은 곳에 떨어져 동서남북은 물론 좌우, 상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진다. 나는 동아시아 회화에서 작가의 움직임이 화면에 투영되는 방식에 일종의 솔직함을 느끼고, 여전히 일정한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해 가능한 영역 안에서 재료를 다루는 것은 시각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되지만, 때로는 재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때 이해의 영역이 넓어진다. 구체적인 시각적 규칙이 없는 회화에서 나는 인간 신체의 조건에서 새로운 규칙을 찾을 수 있다. 직사각형의 나무 틀이 캔버스로 덮인 것처럼 작가가 그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상상하는 것이 재미있다. 화면 속 재료의 질감과 흔적은 움직임의 흔적을 끊임없이 암시한다. 마감의 세부 사항, 효과가 가리키는 각도의 변화, 거리의 설정은 작가가 재료에 어떻게 반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자에서 관찰자로 변모했는지 상상하게 한다.
나의 관심사는 새로운 상호보완성을 찾거나 물질들 간의 숨겨진 관계를 파헤치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증이 아니다. 소중한 것을 손에 쥘 때 우리는 오감이 실제로 세상을 얼마나 다른 속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각자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의 범위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감각 하나하나의 민감성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물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질 하나하나의 속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상응하는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나의 관심사는 호흡, 시선, 균형감각에 존재하는 본능적인 일체감이 여전히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오랜 시간 시각적 규칙을 구축해 온 전통 회화의 이미지는 물질로 축을 이루었던 신체의 고정된 개념이 바뀌면서 그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그림을 온전히 따르거나 감상할 수 있는 공통된 신체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기술 혁명 이후 물질과 비물질, 현실과 가상성의 경계가 전례없이 모호해졌다. 이 시점에서 나는 여전히 물질적인 제약을 우리의 감각과 감정이 적재적소에 놓이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 그림, 조각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효율적이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작품은 작품을 제작한 작가의 신체와 그들의 행동을 제안한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몸의 지위에 대해 알수없는 누군가와 오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1] 조용진. 동양화 읽는법, 한국화가 당면한 문제와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180p
When I was in kindergarten, crayons had a color called “skin color” (CMYK 0 24 24 0). Someone suggested to the Korean Industrial Standards to change the name to “light-orange” when I was 10 years old as a matter of racial discrimination. A few years later, It became ‘light apricot”again due to an Primary School student's complaint that the name was too difficult to remember.
I pondered, “what was the first moment I remember?” We can’t be sure if any memory is really the first. There are a few chunks of memory that could be the first, but every chunk has a moment of suspicion. I remember the moment when I reflected on the mysterious color between my fingers while covering the sun with my hands. I remember a friend I met when I was young whose name I don’t even remember. He said, "this is real skin color.” I answered, “what is skin color anyway?”
Yes, as other people said, I must have come out of my mother's body. But it still bothers me that I don't remember the very first moment. What happened in the past is like processed food. When you open the lid, it’s just as it was when it was stored, but atimes, whether we become different people every certain time or whether someone else is constantly being born within us. An unanswerable doubt by a creature oblivious to the passage of time.
I always cook processed food again with heat for my health. It feels like I'm fixing broken things. I stack the ingredients with such strong tastes in order and take them to the “good to eat” area. Add vinegar when it's too sweet, sugar when it's too sour, vinegar or sugar when it's too salty. What does it taste like to have an unprocessed memory?
#3 피부색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크레파스에는 "피부색"(CMYK 0 24 240)이 있었다. 내가 열 살이 되었을때 인종 차별적이라는 의견으로 한국산업표준원에 "연한 오렌지색"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었다. 몇 년 후, 이름을 기억하기 너무 어렵다는 한 초등학생의 불평으로 인해 그 색은 다시 '연한 살구색'이 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순간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다. 어떤 기억이 정말로 첫 번째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기억 덩어리가 몇 개 있지만, 모든 덩어리에는 의심의 순간이 있다. 손으로 태양을 가린 채 손가락 사이의 오묘한 색을 되새기던 순간이 기억난다. 어렸을 때 만났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친구가 생각난다. 그 친구가 말하길, "이게 진짜 살색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 살색이 뭔데?"라고 대답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이 나는 분명히 내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첫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가공식품과 같다. 뚜껑을 따면 넣었을 때와 다름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특정 시간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같기도, 아니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의 길을 알 수 없는 존재가 가지는 대답할 수 없는 의심이다.
나는 항상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을 열로 다시 조리한다. 고장난 것들을 고쳐가는 느낌이다. 그런 지나친 맛을 가진 재료를 순서대로 쌓아두고 '먹기 좋은' 영역으로 데려간다. 너무 달면 식초, 너무 시면 설탕, 너무 짜면 식초나 설탕을 넣는다. 가공되지 않은 기억은 어떤 맛이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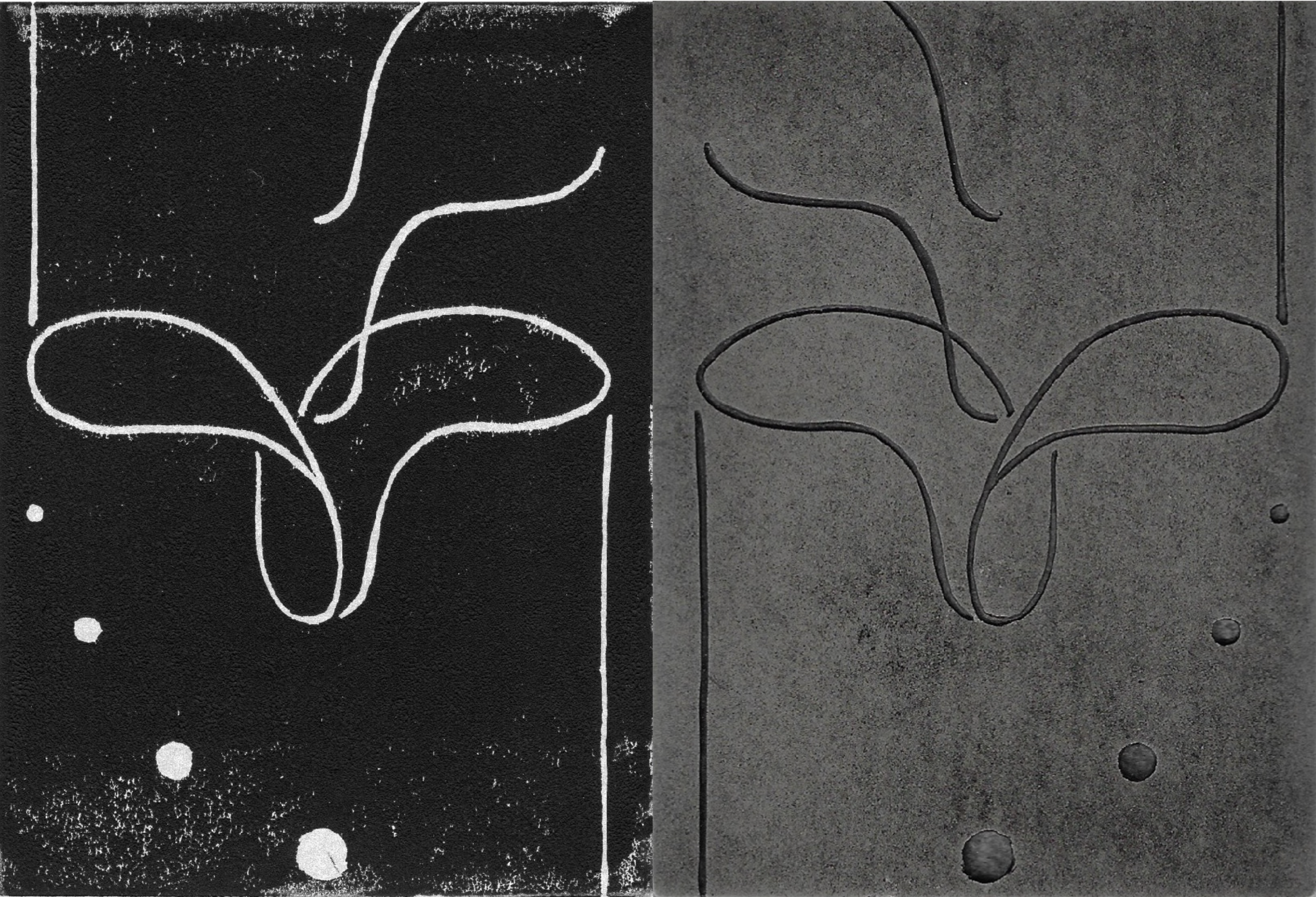
It sounds natural but always surprising that my act of carving out a plate in relief print has a dichotomous result such as: printed or not printed, black or white. It feels more like an implicit law than a phenomenon. It's a simple technique, but sometimes it's hard to predict and there's something that compels one to follow.
In the process of carving and printing a plate, questions about direction always arise. It is so natural that all of the prints we know were originally inverted from left to right that hardly anyone even considers it. My sense of direction is not very good. When I entered Elementary School, my classmates could distinguish between their left and right hand from any point in any direction, as if they were all in consensus. I didn't really understand the concept, but I could see it was my right hand by reiterating that my nail scar was on the right. It is an even worse nightmare to distinguish between the right and the left of others. Whose standards should I follow when facing another? Since the engraved side faces down to reach the surface of the paper, the shape of the edition is turned left and right. They are facing each other, so the left and right between them cannot be the same. The one who carves it for the promised order, such as a type printing plate placed in reverse order, must twist the image internally.
As I said before,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so I can't draw a line considering the reversal of left and right. Therein lies a contradiction that cannot allow me to be honest even if I keep my promises. In my first printmaking class, I learned to draw on tracing paper and flip it over so I could transfer the “original” sketch to the plate. However, because this is not engraving an image on the plate, many of the lines and dots I want to make arbitrarily are filtered out in the process of using tracing paper. Still, I carve the way I see. This is not to twist the image, and to accept the risk that the viewer will not see my gaze in the same direction. Weirdly, I never felt it was a problem. Because my image has to be the criterion for what I see or what I'm trying to find, I have to stay in the unprocessed spot to avoid confusing its direction. Like a nail scar, I have to have a mark that sets one standard. If so, can I really conclude that my right hand is only on the left side of those who face me?
Somehow, my prints often find their way as a gift for someone. The process of pairing somebody who will be its owner between certain figures is interesting. It's also my pleasure to see them looking at prints. It is not all of my devotion because it is a clone, and it is not all of my gaze because it is an inverted image. So they may be fit to be a gift. This level of distancing is quite balanced. Even if I show the plate, the response won't bring much. This may be because the distance created by the edition is familiar rather than the plate. In the end, but still, the place where the carving knife passed is white, and the place where it didn't is black. Why do I feel comfortable when my most honest original work is not shown intact within the riddle of dichotomy?
#4 두 개의 방향, 두 개의 세상
판을 깎는 나의 행위가 인쇄의 여부, 흑과 백이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항상 놀라운 일이다. 현상이라기보다는 암묵적인 법칙처럼 느껴진다. 간단한 기술이지만 때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거기엔 따라야 할 무언가가 있다.
판을 조각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는 늘 방향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판화들이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전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누구도 그것에 대해 생각 하지 않는다. 나는 방향감각이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은 마치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어느 방향에서든 왼손과 오른손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해는 안됐지만 손톱자국이 오른쪽에 있다는 걸 반복해서 보며 오른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하는 것은 더욱 나쁜 악몽이다. 다른 사람과 마주할 때 누구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새긴 면이 아래로 향하여 종이 표면에 닿게 될 때 판의 방향은 좌우가 바뀌게 된다. 종이와 판은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왼쪽과 오른쪽이 같을 수 없다. 약속된 순서를 위해 조각하는 사람은 활자판을 역순으로 배치하는 등 내부적으로 이미지를 비틀어야 한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방향감각이 좋지 않아서 좌우 반전을 고려하며 선을 긋지 못한다. 거기에는 약속을 지키더라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첫 번째 판화 수업에서 나는 트레이싱지에 그림을 그리고 뒤집어서 "원본" 스케치를 판에 옮기는 방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는 판에 직접적으로 이미지를 새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싱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만들고 싶은 선과 점들이 많이 걸러지게 된다. 여전히 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파낸다. 이는 이미지를 비틀기 위한 것이 아니며, 관객이 나의 시선을 같은 방향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것이다. 이상하게도 그게 문제라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내 이미지는 내가 보는 것, 내가 찾으려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처리되지 않은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손톱 흉터처럼 하나의 기준을 정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내 오른손이 나를 마주한 이들의 왼쪽에만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내 판화는 종종 의도치않게 누군가에게 선물로 전달된다. 특정 형상들 사이에서 주인이 될 사람을 짝짓는 과정이 흥미롭다. 그들이 판화를 보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즐겁다. 복사된 것이라 판을 만든 내 노력의 전부도 아니고, 반전된 이미지라 내 시선의 전부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판화는 선물로 적합할 수 있다. 이 거리두기 정도은 상당히 균형 잡혀 있다. 원판를 보여줘도 큰 반응은 없다. 원판보다 에디션이 만들어내는 거리감이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그래도 조각칼이 통과한 곳은 흰색이고, 통과하지 못한 곳은 검은색이다. 나의 가장 정직한 원본이 이분법의 수수께끼 속에서 온전히 보이지 않는 데 나는 왜 마음이 편해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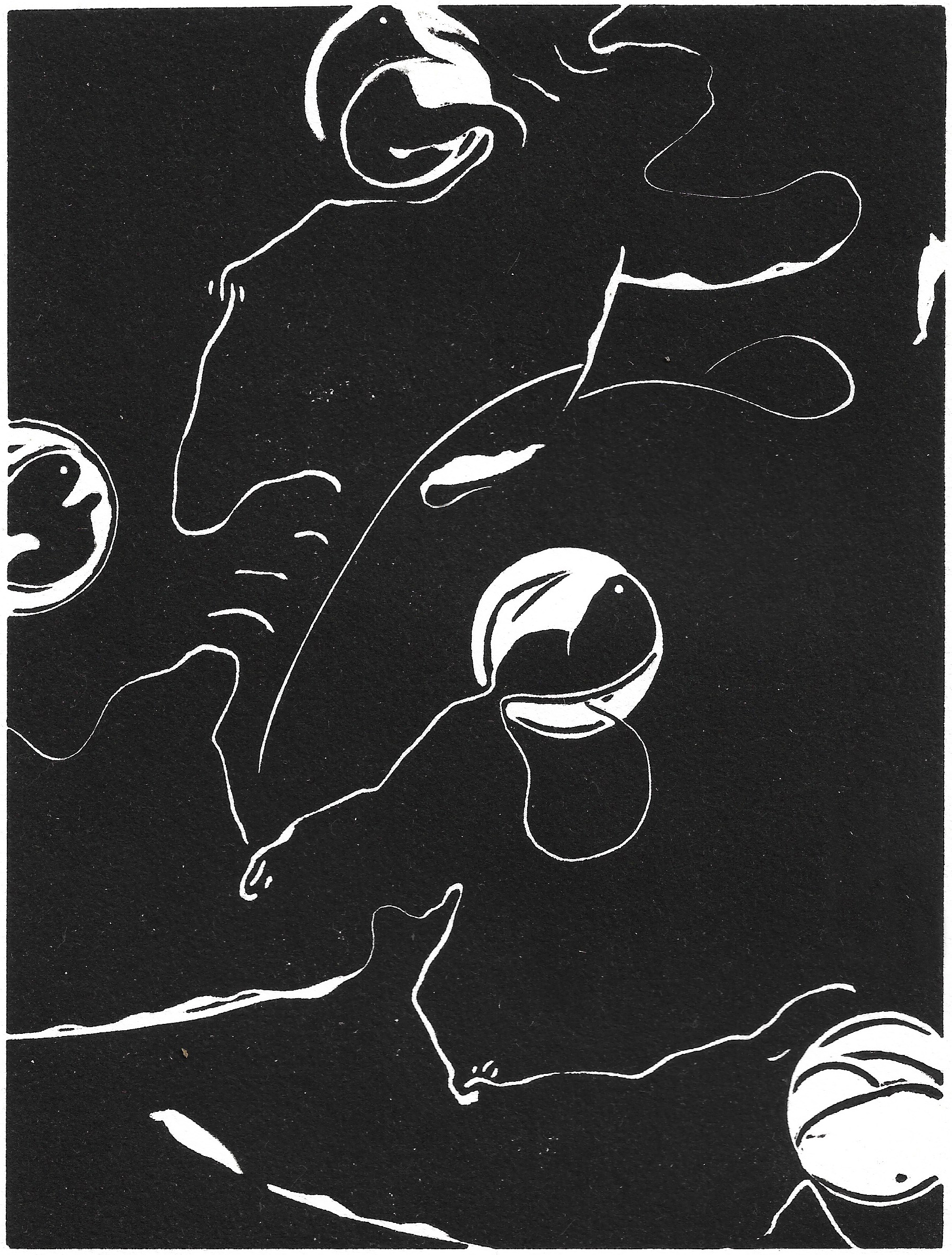
I'm afraid of hardening, so I keep swimming
Give yourself a reprimand for not loving yourself
To be properly hardened, I must go deeper where no one can find me
The summer of swimming in the middle of a lake without no place to hold
Floating around with your eyes closed for a while, soon the sense of direction disappears
Draw your limbs on the unknown color of sunlight shining on your eyelids as if you are in womb
Imagining where the lake, downtown,
or even farther away where we were
Which side of your limbs is pointing out to them?
Maybe we're not pointing to anything after all,
because where we are is at different altitudes
Maybe my voice won't reach the plateau where you're on
A distance as thin as a membrane but impenetrable
But I know you're feeling it there just as I do
The feeling makes me not sink back to where I was
#5 가리키기
굳는게 무서워서 나는 계속 헤엄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질책해야한다
확실히 굳어버리려면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한다
한 여름의 호수 한가운 데 잡을 곳이 하나 없는 곳에서의 수영
눈을 감고 잠시 떠 있으면 곧 방향감은 사라진다
마치 자궁속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눈꺼풀에 비치는 알 수 없는 햇빛의 색 위에 팔다리를 그려보자
호수, 시내, 혹은 더 멀리 우리가 있었던 곳을 상상해보자
팔다리의 어느 쪽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나?
어쩌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곳은 고도가 다르니까
어쩌면 내 목소리가 네가 있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피막처럼 얇지만 뚫을 수 없는 거리
하지만 당신도 그 곳에서 나와 같이 감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그 감각

The story that my mother watches stir-fried anchovies in the kitchen longer than seeing me on the last day before leaving on a long journey.
Mom's stir-fried anchovies are of two types. One kind are white anchovies coated with sugar and walnuts, and the other are red anchovies fried in red pepper paste. When I went to China and lived apart from my family in Seoul, and when I came to the Netherlands, the anchovies always followed me. Stir-fried anchovies with a lot of calcium that make the bones strong. They don’t go bad for a long time, and my mom always makes them the last night before I go.
I tend to fix the paintings very often at the end. Spit it out a long time ago already, like words which can’t be taken back. It is a deceptive act to add present determination on an already finely faded surface. Therefore, it requires greater certainty. I was ashamed of my habit of doing this. Like most questions about self-confidence, there is anxiety. The habit of fixing paintings also made me wonder whether it was because of my sluggish personality or an arrogant act of ignoring my previous decisions. “I should have done it well from the beginning.” But I know I will come back to this no matter how finely I finished the paining.
Repeating one thing is not only creating one habit, but also a journey to find the reason for another habit. Habits are like problems, when one disappears, one appears. Why do I habitually want to fix the picture? The painting doesn't change as fast as I change. The people I want to show the painting change, but the painting does not change. I adapt, but refuse to adapt to a picture that has already been hardened. Would it be appropriate to put new flesh on top of such a painting again?
The materials of the painting meet in one place and stay with me for a while, but they have a different fate with me because they are originally from outside. The moments when I decide to revise a painting usually start with the premonition that I won't be able to see it very often anymore. Refine the rough surface, give it a more luminous color, or straighten the boundaries between distracted textures. Maintenance maybe someone else won't do or no one else can do but myself. Cover the fine gaps and dust them off until the end so that they last only a day. I leave my traces of different times within a small area that perhaps no one will even see. It's the most desirable thing to keep looking at for the rest of time, but the desire to be remembered in the future is even greater.
There are times when I don't know what I want from a painting, but I am still attached to it. It is sad because there was an irresponsible beginning. Prayer is necessary because it will be left unattended.
The story that my mother watches stir-fried anchovies in the kitchen
longer than my face on the last day before leaving a long way.
#6 그림을 고치는 습관에 대해
먼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엄마가 주방에서 멸치볶음을 지켜보는게 나를 보는 시간보다 길었던 이야기.
엄마가 만들어주는 멸치볶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설탕과 호두를 입힌 하얀 멸치이고, 다른 하나는 고추장에 볶은 붉은 멸치다. 중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서울에서, 네덜란드에서 늘 멸치는 따라다녔다. 멸치볶음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한 요리다. 오랫동안 상하지 않아서, 내가 떠나기 전날 밤에 엄마는 항상 만들어 준다.
나는 그림을 마지막에 고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오래전에 뱉었는데, 마치 되돌릴 수 없는 말처럼. 이미 희미하게 바랜 표면에 현재의 결심을 더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습관이 부끄러웠다. 자신감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는 불안도 있다. 그림을 고치는 습관이 나태한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의 결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 때문인지 궁금했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그림을 아무리 정교하게 완성하더라도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가지를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습관의 이유를 찾기 위한 여정이기도 하다. 습관은 문제와 같아서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가 나타난다. 나는 왜 습관적으로 그림을 고치고 싶은 걸까? 그림은 내가 바꾸는 것만큼 빨리 변하지 않는다.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변하지만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적응하지만, 이미 굳어진 그림에 대해서는 적응하고 싶지않다. 그런 그림 위에 또 다시 새 살을 얹는 것이 합당할까?
그림의 재료들은 한곳에서 만나 한동안 나와 함께 머물지만, 본래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나와 운명이 다르다. 그림을 수정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은 대개 그 그림을 더 이상 자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에서 시작된다. 거친 표면을 다듬고, 더 밝은 색상을 부여하거나 산만한 질감 사이의 경계를 정리한다. 다른 누군가가 앞으로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라지만 나 외에는 누구도 못하는 것 일 수 있다. 미세한 틈을 메우고 마지막까지 먼지를 털어내면 그 상태는 하루정도 지속된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작은 곳에 여러 시간의 흔적을 남긴다. 주어진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테지만, 그것으로부터 기억되고 싶은 욕구가 더욱 크다.
그림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때로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애착을 가질 때가 있다. 무책임한 시작이 있어서 안타깝다. 방치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
Like those inaccessible spaces that are quickly omitted when you get on the train, things that I encounter on the first road pass by forming a band without focus. Objects keep their shape for a while only when I rapidly turn my head to match the speed of the train and look at one place. The clarity with which we can read a letter is only around 20 degrees out of a viewing angle of about 200 degrees. Those things outside the window seem touchable, but I will not actually touch them, and even if I want to remember them, they will be quickly forgotten. Like the area outside the 20 degrees, it disappears in order of shape, color, and movement.
When I pass a strikingly beautiful or unusual place through the window, I quickly turn on google maps and insert a pin into a gray, unmarked space. Always the most “present” map leads us to where we want to be most accurately, so we collect a pins where we want to visit someday. The spaces on the map give me the illusion of being able to reach them clearly with a pin inserted anywhere, but the list of“places I want to go" is mostly forgotten in the same way.
When I was a child, I always sat in the back seat and watched my dad drive, and my mother opened a paper map next to him and gave directions. When we followed the signs and passed a new road that was not yet marked, we were running on the sea or rice field on the map. Now the paper map has disappeared from the glovebox and the navigation in my phone continues to update and seamlessly estimate the world. Latest maps quickly become inaccurate maps like a mirage, and the place for traces of past paths on updated maps lost their spot. As time goes by, the moving lines are divided densely or loosely, and such a familiar path becomes one that has never been again.
Maps that are getting sharper and clearer don't give me any space for doubts. The image gives me the illusion that I'll be able to look back on all the paths I've been on as long as the battery doesn't run out. But my sense of space moves along the band of memories and creates a sense of alienation in real space. Whenever the band meets a point where it has passed, or reconnects to a memory that has been forgotten, the memories in between have to find their own place again. Lost memories can disappear without being seated anywhere or survive as a familiar background of dreams.
The shapeless starting line, which has the risk of not being found, and which doesn't want to be seen by anyone but is disappointed if no one finds it, has always been on the road not featured on a map. Many precious things that are not marked, such as freckles and wrinkles that only close people can see, symbols that no one can read because no one is looking for them are hidden somewhere on the map.
#7 매핑 에러
기차를 타면 금방 사라지게되는 그 접근 불가능한 공간들처럼 초행길에서 마주치는 것들은 초점 없이 띠를 이루어 지나간다. 기차의 속도에 맞춰 고개를 빠르게 돌려 한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사물들은 한동안 형태를 유지한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선명도는 200도 정도의 시야각에서 20도 안팎에 불과하다. 창밖의 사물들은 만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만지지 않을 것이고, 기억하고 싶어도 금방 잊혀질 것이다. 20도 밖의 영역처럼 형태, 색상, 움직임의 순으로 사라진다.
나는 창문을 통해 눈에 띄게 아름답거나 특이한 장소를 지나갈 때 재빨리 구글 지도를 켜고 표식이 없는 회색의 공간에 핀을 꽂는다. 항상 가장 '현재'에 있는 지도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장 정확하게 안내하기에 언젠가 방문하고 싶은 곳을 핀으로 수집한다. 지도 위의 공간은 핀을 꽂으면 어디든지 선명하게 닿을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가고 싶은 곳' 목록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잊혀진다.
어렸을 때 늘 뒷좌석에 앉아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엄마는 아빠 옆에 종이 지도를 펼쳐 길을 알려주곤 했다. 표지판을 따라가다가 아직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길을 지나갈 때,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바다나 논 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제 글로브박스에서 종이 지도가 사라지고 내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이 계속 업데이트되어 원활하게 세계를 가늠한다. 최신 지도는 신기루처럼 빠르게 정확하지 않은 지도가 되고, 업데이트된 지도에서 지난 경로의 흔적은 자리를 잃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선은 촘촘하게 또는 느슨하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익숙한 길은 다시 가본 적 없는 길이 된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는 지도는 나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 이미지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 한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 공간감각은 기억의 띠를 따라 움직이며 현실 공간에서 낙차를 만들어낸다. 그 띠가 지나간 지점을 만날 때마다, 잊혀졌던 기억과 다시 연결될 때마다, 그 사이에 있던 기억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잃어버린 기억은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은 채 사라지기도 하고, 익숙한 꿈의 배경으로 남아있기도 한다.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면 실망스러운 그 형태 없는 출발선은 늘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길 위에 있었다. 가까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주근깨와 주름, 아무도 찾지 않아서 읽혀질 수 없는 상징과 같이 표시되지 않은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지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When I paint, I often want to be myself a few days later and see the progress of the painting I am working on. I wonder how the spaces that are empty for this reason and filling up for that reason will end. It is natural that paintings are always in that state if I do not put it in any action, but sometimes the fact feels rather unnatural. Until it is settled with only one probability of completion among so many possibilities, the different textures and colors around the canvas continue to ask me whether it is okay to leave them as it is or if it is okay to solidify as it is.
The process of painting requires considerable introspection. I value the patience to wait for the door to open and the self-censorship of noticing when the image gradually dissipates and only the form of action remains. Through this, I get a residue rather than a creation in my hands. There are always some commands that linger in my head at that time. They could be made from any sentences of the book I have been digesting or the after images of all kind of visual information I have in my memory. The interests of those days and the nature of their properties secretly affect the materials and colors that I want to use. Depending on the painting, there is a painting that ends with interest in the subject of the time, and some paintings are not persistently completed during the two or three changes in the general subject, and are mixed with layers of different time lines. Surprisingly, the trajectory of time, which is so confusing for me, is casually gathered in one place in the painting. So even though the painting is fixed as an image and ended, the sense of distance from me constantly changes.
I prefer picturing in my mind rather than physical sketching when I start. In the process of painting with a sketch, I lose my backbone more easily and start to fill the space without self-censorship. If the screen is filled with such a will, with a very high probability it becomes a task that I must cover again tomorrow. The next morning, I take a deep breath and imagine the part of painting I am not satisfied with as if it were an empty, colorless, odorless space, and mind other images that deserve it. However, my habit of painting without sketches creates a chronic dilemma. The most realistic problem is that the time for the painting to be completed can be deferred, and after it is completed, it becomes difficult for me to clearly explain, the meaning has been forgotten. I partially add gesso according to the color I want to implement, and this background work in different time lines creates fine marks and thickness differences throughout the screen. Such differences may affect the coloration, and sometimes naturally suggest the boundaries of the shape. The process that cannot but be continuously nested leads to a problem of the time taken after the work is completed. Depending on how much the artist intends to preserve their work, the order between layers composed of different physical properties must be considered. In what ways can the image be proved to exist at this time, and where is the time that the image has led to?
Even though the painting of an unknown artist on the internet sometimes gives me a fresh shock, I haven't always wondered more about the higher resolution or it’s physicality. I know that the work will have a variety of angles in some certain places, but I have already become accustomed to looking from a given distance. There is nothing as boring and sad as generalizing my experience to contemporary errors. Rather, the focus of the question seems to be on not knowing why I have such a tendency while reacting like that. Fine stains or color differences that can only be seen 1 meter ahead, random bends, and bumpy surfaces created by hair from brushes are ironed very smoothly and clearly in the picture. If so, does it mean that even I, who paints, admit the image transformed into a picture. The ending is too futile for a painting that is woven and covered with flesh and dressed in layers of agony. What's more incomprehensible is that even I, who made it, am used to the futility.
This effort to escape from the endless loop of thought results in a moment of completion. Accepting my lack, believing that what I have gained through the process is positive, I quickly turn a blind eye to the futility of finishing the painting. What has changed is that the space of my studio and the capacity of my computer's drive have been reduced by the volume and weight of my transient worries.
#9 덧 없는 걱정의 부피
그림을 그릴 때면 며칠 뒤의 내가 되어 작업 중인 그림의 상황을 보고 싶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이유로 비워지고, 저런 이유로 채워지는 공간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하다. 그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늘 그 상태인 게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 사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수많은 가능성 중 단 하나의 완성된 확률로 해결될 때까지, 캔버스 곳곳의 질감과 색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지, 그대로 굳혀도 괜찮은지 계속해서 묻는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상당한 성찰이 필요하다. 나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이미지가 점차 사라지고 행동의 형식만 남을 때를 알아차리는 자기검열을 소중히 여긴다. 이를 통해 나는 창작물이 아닌 잔여물을 손에 넣는다. 그럴 때면 늘 머릿속에 맴돌던 명령이 있다. 그건 내가 소화해온 책의 어떤 문장이나, 내가 기억하는 여러 시각정보의 잔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 시대의 관심이나 물성의 성격이 내가 사용하고 싶은 소재와 색상에 은밀히 영향을 미친다. 당시의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는 그림도 있고, 어떤 그림은 주제가 두세 번 바뀌는 동안 끈질기게 완성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시간의 겹이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놀랍게도 나에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시간의 궤적이 무심코 그림 속 한 자리에 모여 있다. 그래서 그림이 이미지로 고정되어 마무리되더라도 나와의 거리감은 끊임없이 변한다.
나는 시작할 때 물리적으로 스케치하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스케치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는 더 쉽게 주관을 잃고 자기검열 없이 공간을 채우기 시작한다. 그런 의지로 화면에 채우면 내일 또 다시 덮어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다음날 아침, 나는 심호흡을 하며 내가 만족하지 못한 그림의 부분을 마치 텅 빈, 무색, 무취의 공간인 것처럼 상상하며, 그 곳에 있을 만한 다른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러나 스케치 없이 그림을 그리는 내 습관은 만성적인 딜레마를 낳는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그림이 완성되는 시기가 미뤄질 수 있고, 완성된 후에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져 의미가 망각된다는 점이다. 구현하고 싶은 색상에 따라 젯소를 부분적으로 덧대며 만들어진 서로 다른 시간대의 배경은 화면 전체에 미세한 자국과 두께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차이는 색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때로는 형태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암시하기도 한다. 연속적으로 중첩될 수밖에 없는 과정은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얼마나 보존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으로 구성된 레이어 사이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이미지의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미지가 이끌어온 시간은 어디인가?
인터넷에 떠도는 모르는 작가의 그림이 가끔 신선한 충격을 줄때도 있지만, 그 작업물의 고해상도 사진이나 물리적인 작업에 대해 항상 궁금해하지는 않는다. 작품이 장소에따라 다양한 각도를 가질 것이라는 건 알지만, 이미 주어진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나의 경험을 현시대의 부작용으로 일반화하는 것만큼 지루하고 슬픈 것은 없다. 오히려 내가 이런 반응을 가지면서 왜 그런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데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진다. 1m 앞에서만 보이는 미세한 얼룩이나 색상 차이, 무작위로 구부러진 부분, 붓의 털로 인해 생긴 울퉁불퉁한 표면이 사진에서 매우 매끄럽고 선명하게 다림질된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는 나 역시 그림이 사진으로 변하는 것을 긍정한다는 뜻인가. 살로 깁고 덮어 겹겹이 번민의 옷을 입힌 그림치고는 결말이 너무 허무하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만든 나조차도 그 허무함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끝없는 생각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노력은 완성의 순간으로 이어진다.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이 긍정적이라고 믿으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의 허무함을 금새 눈감아준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나의 이런 일시적인 걱정의 양과 무게로 인해 작업실의 공간과 컴퓨터의 드라이브 용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 Nelson Goodman. Ways of World Making. Hackett Publishing Co, Inc. 1978
- 조용진 Yongjin Cho. 동양화 읽는 법 How to read Oriental paintings. 집문당. 1998
- Giorgio Agamben. Man without contents. 자음과 모음. 2017
- Vilém Flusser. Gestur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 John Durham Peters. The Marvelous Clouds: Toward a Philosophy of Elemental Medi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 Carl Gustav Jung. Memories, Dreams, Reflections. William Collins. 1995
- Jacques Aumont. The Image. British Film Institute. 1997
- #2 Two orbits, Lino cut, 10 × 7, 2019
- #5 Hand in hand, Lino cut, 20 × 15, 2021
- #8 Ring and finger, Lino cut, 20 × 15, 2021